-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1371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1371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1372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1372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1372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1372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1372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1372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1372 days ago
- 앙코르톰 성문에서 압사라 조각 발굴Posted 1372 days ago
[나순칼럼] 죽음의 방식, 혹은 삶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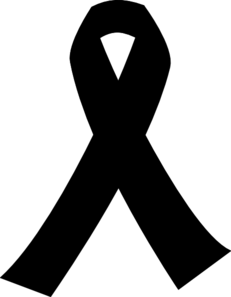
인간에게는 병을 자랑하려는 심리가 있다.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환자일 때뿐이라서 그런다고 한다. 약점을 들키는 순간 상대의 먹이감이 되고 말아, 자신의 병색을 감추려 애쓰는 동물 세계와 대조적이다. 돌아가신 시모께서도 말년에 병원출입이 잦아지시면서 “어미 보러 자주 오렴” 하시는 대신, “나는 환자다!” 고 투정 하셨다.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 받고 싶어 하는 존재인 까닭이다. 언제부턴가 죽음을 앞두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는 게 통과의례처럼 되었다. 노화로 인해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는 사람까지 온갖 의료장치에 매달리게 해 소중히 누려야 할 실낱같은 시간조차 앗아가 버리곤 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다 죽는 사람이 매년 3만 명이 넘는다니.
인터넷 블로그에서 만난 이웃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인생을 건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야 누구에게나 구김살은 있는 법, 그분에게도 좌절이 있었지만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었다. 일흔을 앞두고 수술이 불가한 췌장암 말기, 6개월의 삶을 선고받았다. 지인들과 병원측에서 표준적인 병원치료를 권했지만, 아내와 가족을 설득해 퇴원한다. 이만하면 만족스러운 삶이었고 6개월이면 정든 사람과 헤어지기에 좋은 시간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후 일상을 통해 병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블로그에 올린다. “아내와 매일아침 산책이 암이 내게 준 뜻밖의 선물이다.”로 시작된 투병기는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삶의 이력이나 연령대나 사이버 세상이 아니면 만나기 힘든 분이었는데 유명인이 아닌 사람의 죽음이 이토록 마음을 흔든 건 처음이다. 나에게도 닥칠 소멸과 결별에 대한 예감 탓도 있지만, 죽음에 임하는 그 용기의 울림이 큰 탓이리라.
“죽기에는 암이 최고다.” 오랫동안 노쇠사 과정을 지켜본 일본 의사 나까무라 진이치의 말이다. 고령의 말기암인 경우 ‘이제는 살만큼 살았으니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돌아가자’는 신호로, 거의 임종까지 의식이 명료해 마지막 기간 동안 삶을 정리하기에는 암이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이다. 그는 노화는 병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라며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생명연장 대신 자연사를 권한다. 자연은 그리 가혹한 게 아니어서 기분 좋게 몽롱하고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게 해 우리 조상들은 모두 그렇게 ‘무사히’ 죽어갔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바람결에 홍시가 떨어져 대지로 스며들듯 자연사에 대한 나까무라의 생각에 동의하지만 죽을 때를 미리 알고 싶지는 않다. 예정된 죽음을 몇 달 몇 년씩 기다리기엔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영원한 사랑은 그 사랑이 떠난 후라야 가능하리라.
“오늘은 죽기에 좋은날 / 나를 둘러싼 저 평화로운 땅 / 마침내 순환을 마친 저 들판 / 웃음이 가득한 나의 집 / 그리고 내 곁에 둘러앉은 자식들 // 그래 오늘이 아니면 언제 떠나가겠나.” 그 분의 죽음(혹은 삶)에 어울리는 인디언의 오래된 시다. / 나순 (건축사, http://blog.naver.com/naarch)







